각시님, 달이야 커니와 구즌 비나 되소서(각시님, 달은 커녕 궂은 비가 되세요)
_『속미인곡』, 정철
시는 왜 어려울까요. 어떤 시인은 한 인터뷰에서 때때로 시가 돌덩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시를 쓰는 당사자인데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만들어내는 은유의 아름다움을, 비유의 확장성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 인용문은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속미인곡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달이 되어 사랑하는 임이 계신 방안을 비추고 싶다는 화자의 말에, 그러지 말고 궂은 비가 되어 임을 흠뻑 적시라고 대답하는 또 다른 화자의 목소리죠. 이 문장을 통해 필자는 시가 주는 희열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비유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을요. 하지만 시를 읽고 싶은데 어떤 의미나 재미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시를 짓는 시인들의 산문을 먼저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시집을 들었을 때 인과를 깨고 등장하는 단어나 함축된 세상이 새롭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시차 노트』, 김선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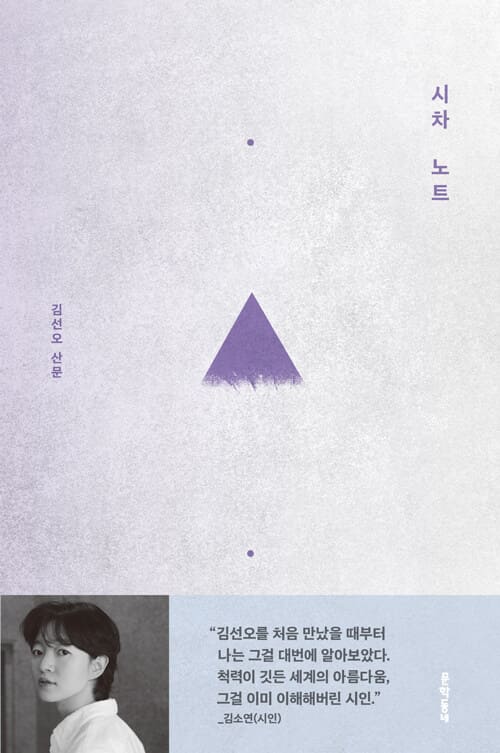
나는 단어들을 관광했다. 이 단어에서 저 단어로 걸어가보기도 했다. 어느 단어 속에 떠 있던 구름이 다른 단어를 향해 흘러가버리거나 한 단어에서 발견한 소리를 다른 단어를 향해 흘러가버리거나 한 단어에서 발견한 소리를 다른 단어 안에서 듣게 되기도 했다.
_『시차 노트』, 김선오
손을 잡으면 손안에 터널이 생긴다. 우리의 손등이 터널의 외부를 지을 때 세계는 작은 터널이라는 비밀을 간직한 장소로 변모하고, 우리는 손안의 어둠이라는 비밀을 생성하고 수호하는 두 사람이 되어 걸어간다. 터널을 들고 터널 안을 걷기. 터널의 안은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어 빠르게 달리는 차들 곁을 느리게 걸을 수 있다.
_『시차 노트』, 김선오
『시차 노트』는 두 단어 사이를 오가며 써 내려간 김선오 시인의 사유가 담긴 산문집입니다. 봄과 터널에 대하여, 돌과 글에 대하여, 동떨어진 두 단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길고 아름답게 연결 짓는 김선오 시인의 필력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그의 시선을 거치면 어떤 단어라도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글 속에서 그가 택한 소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누적된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한 단어를 떠올리면 단어 자체의 이미지보다 어떤 장면이 한눈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내가 없는 쓰기』, 이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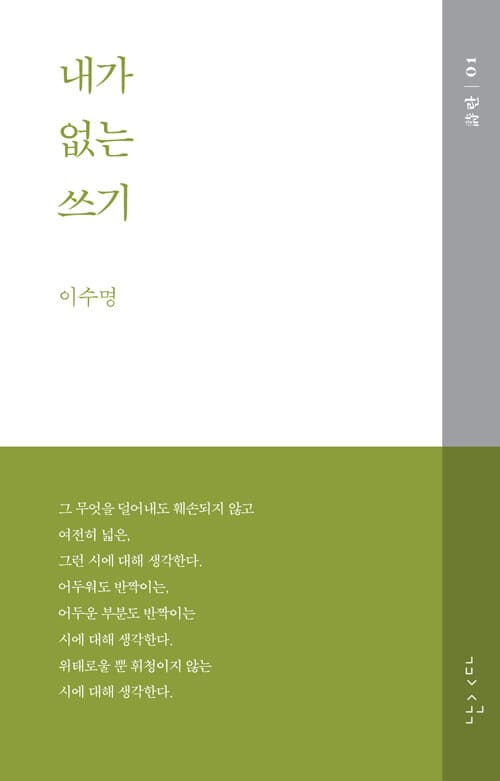
구름이 기울어져 있듯이, 건물이 기울어져 있듯이,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이 기울어져 있듯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시 때문이다. 마음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다. 시를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종종 들어선다.
_『내가 없는 쓰기』, 이수명
글을 쓰는 것은 현실로부터 고립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것을 낭떠러지라 할 수 있다면 낯선 낭떠러지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언어는 나를 날카롭게 관통하지만 그것은 예외 없이 살짝 비켜선다. 나는 언어를 통해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언어로 인해 나는 집중되고 더 많이 이완된다.
_『내가 없는 쓰기』, 이수명
『내가 없는 쓰기』는 이수명 시인의 일상을 한 두 페이지 분량의 짤막한 단편으로 묶은 산문집입니다. 일 년간 날짜 없이 쓰인 일기를 달별로 묶은 책으로 어떤 구조나 외양을 갖춘 작품보다 시간의 흐름에 맞게 유유히 흘러가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책 머리에 ‘권유가 아니었으면 새로운 풀들이 웃자라 있는 풀밭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쓰다보니 발견한 장면들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시를 쓰는 어려움이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사뭇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시상이 찾아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운 마음. 명망 높은 시인도 두려움을 갖는다니! 괜히 위로가 됩니다.
『영혼의 물질적인 밤』, 이장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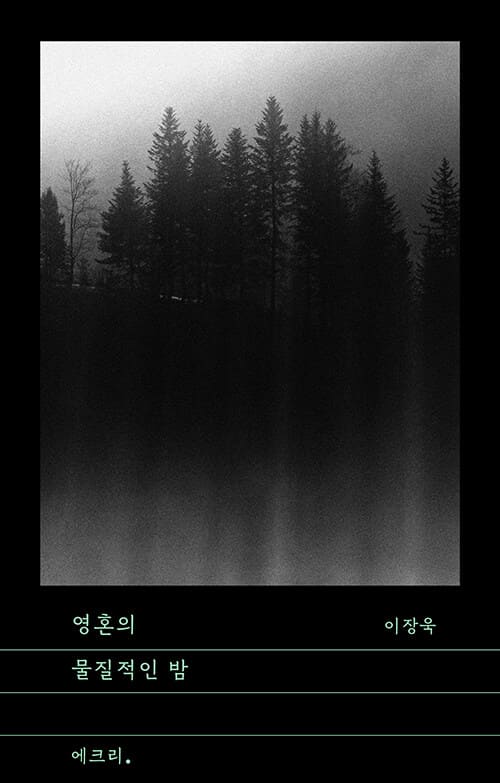
대다수의 경우 예술가는 더 이상 ‘직업’의 이름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상태’의 이름에 걸맞을 것이다. 예술의 가능성, 예술의 미래를 거기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나는 이 문장을, 간신히, 낙관적인 기분으로 적고 있다.
_『영혼의 물질적인 밤』, 이장욱
소설을 쓰는 일 자체보다는, 아직 소설이 아닌 무엇을 떠올리는 일을 나는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가령 하루오라는 인물에 대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오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문득 눈을 뜨는 순간을. 눈을 뜬 하루오가 미소를 짓거나 걸어 다니는 순간을. 그러다가 문득 사라져버려서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순간을.
_『영혼의 물질적인 밤』, 이장욱
『영혼의 물질적인 밤』 은 시와 소설을 함께 쓰는 이장욱 작가의 메모를 묶은 산문집입니다. 러시아의 추바시로 여행을 떠나는 일기로 시작해 시에 대한 단상, 소설을 써 내려간 작가의 감각이 생생히 담겨있습니다. 철학과 자유와 시와 소설. 어느 것도 대충 넘겨짚을 수 없다는 듯이 써 내려간 산문집은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꼬리에 꼬리 물기로 이어지는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옥보다 더 아래』, 김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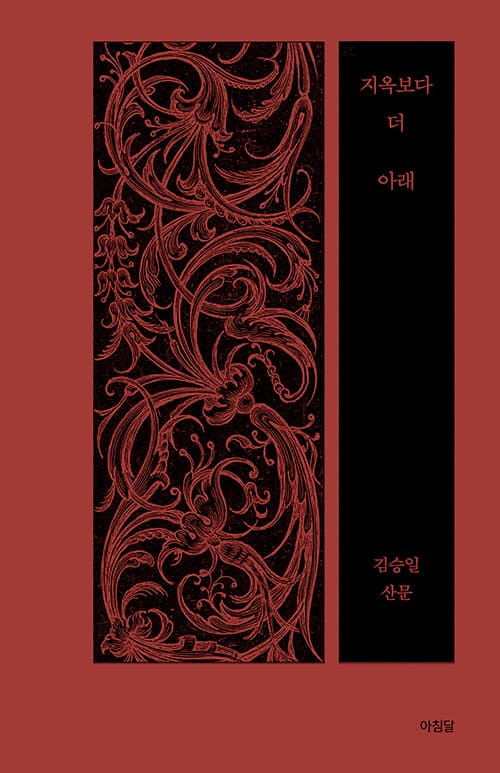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리 멋진 시를 써도.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시를 좋아하지 않기로 옛날에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다.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가 청각장애인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지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서는 시를 써서 탈옥할 수 없다. 많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이 슬픔이 지옥에서 쓸 시의 소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열심히 슬퍼한다. 그렇게 크게 슬퍼할 일도 아니지만.
_『지옥보다 더 아래』, 김승일
『지옥보다 더 아래』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승일 시인은 죽은 아내를 지옥에서 되찾아 오기 위해 노래를 불러 뱃사공을 감동시켰다는 오르페우스에 자신을 빗대어 지옥 여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김승일 시인의 시 속 화자들이 머무르기도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옥이라는 어마 무시한 단어와 달리 꽤나 해학적이고 유쾌함을 머금은 산문집으로 지옥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인들은 주로 고민을 합니다. 스쳐 지나갈 법한 문제에도 골똘해집니다. 한 단어를 끝까지 쫓아가 캐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글이 바로 시인이 써 내려간 산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산문집들이 같은 것을 보고도 더 넓은 사유와 감각으로 우리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가 더이상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