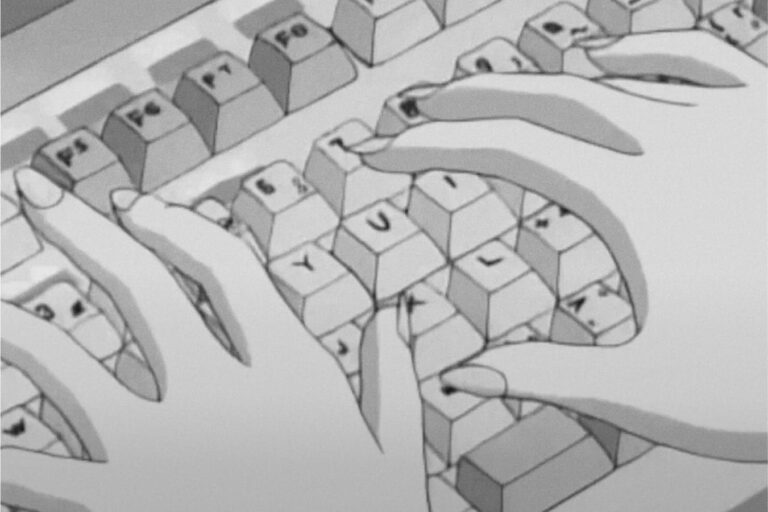존 오브 인터레스트

‘Zone of Interest’는 나치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그 주변 지역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다. 나치가 폴란드로부터 주변 농가를 몰수한 뒤 수용소 포로들을 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던 곳.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 영화의 배경이자 촬영지이자 제목이 되었다. 영화는 홀로코스트의 참상 속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우슈비츠의 사령관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그린다.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영화 중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모습만을 다루는 영화는 흔치 않은데, 이 영화는 단순히 나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관객들이 나치의 입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통은 피해자의 입장에 이입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입장이 되게 한다. 관객이 생각하기에도 부정적인 가해자의 입장을 관객 본인이 어떻게 이입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독특한 연출을 들여다보자.
희극을 보여주고
비극을 들려주는

영화는 100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수용소 안을 결코 비추지 않는다. 실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의 주택을 배경으로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치 가족의 아름다운 집과 정원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뿐이다. 하지만 영화는 오직 소리만으로 수용소 안의 풍경을 그려낸다. 행복해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믹싱된 수용소 안의 비명소리와 불타는 소리가 다른 것들과 섞여 들린다. 그런 불편한 소리는 나치 가족이 내는 일상의 소음과 섞여 있어 명확히 구분이 가지 않고, 관객이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담장 너머에 있는 수용소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소음은 마치 우리가 수용소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기울여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영화의 특징은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동시에 명시하거나 암시한다는 점이다. 눈앞에는 나치 가족의 평안한 하루가 재생되고 있지만 수용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상하게 된다. 상상은 되지만 영화는 수용소를 절대 비추지 않기에, 관객은 도리어 이 아름다운 주택에 갇힌 기분이 들기도 한다. 오히려 수용소의 소리와 상반된 이 가족의 일상과 비극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불편하거나 역겨운 기분까지 들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이런 사운드를 더욱 증폭시키는 연출이 바로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점이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총 5대의 카메라를 고정시켜 두고 동시에 촬영한 뒤, 앵글의 전환이 필요할 시 카메라를 바꿔 사용하는 식으로 촬영했다. 이는 마치 3인칭으로 전개되는 게임과 그 앵글이 비슷하며 관객에게 직접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내가 직접 영화 속 인물을 조정하고 있거나 혹은 상황 안에서 관찰 예능을 보고 있는 듯한 연출. 더해서 영화의 사운드는 카메라가 움직이며 같이 움직이거나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있어 그 연출의 빈 공간을 모두 사운드가 채우게 된다. 카메라가 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도가 없으니 그 배경음에 더욱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브이로그처럼 거친 카메라로 담긴 나치 가족의 일상을 보면서 관객은 이들의 끔찍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그 배경에 들리는 잔혹한 소리에 더 집중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인물은 마치 반딧불처럼 빛난다

이 영화는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필름을 사용해 촬영되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힌 부분이 있다. 바로 아우슈비츠의 한 폴란드 소녀가 밤마다 수용소 현장에 몰래 들어가 유대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숨겨놓는 장면들이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필름용 조명을 따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한밤중의 일을 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다른 모든 장면들과는 반대되는 장면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연출이기도 했다고 한다.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참상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지내는 나치 가족의 모습은 밝음을 넘어 찬란하게 표현되지만, 반대로 진짜로 그들을 도우려 했던 손길을 담은 장면은 가장 어둡게 표현되어 그 정반대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마치 반딧불처럼 빛나는 인물이 있다. 이 장면과 인물은 영화 속의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이미지이며 영화 속 유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선함이다. 찬란한 장면들 너머로 불편한 소리가 계속되던 영화 도중 이렇게 반전된 장면이 나올 때면 관객은 어색하다기보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홀로코스트 참사를 절대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 영화는 그것을 완벽히 해내면서도 동시에 관객이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참사를 들여다보게 한다. 그런 가해자들과 나 사이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묘히 연출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그 누구의 허락 없이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하며 가해자를 탓해왔다. 하지만 홀로코스트 역사는 단순히 한 억압적인 인물이나 정부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닌, 수많은 개인들의 방관과 참여로 이루어졌다. 우리 모두 그 상황 속 개인이었다면 영화 속나치 가족과 달랐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감독은 위의 연출을 통해 비극을 무시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치 가족의 삶 속으로 관객들을 던져 넣고, 나 자신 혹은 인간 본성의 평범성을 돌아보게 한다. 영화에서는 나치와 홀로코스트가 그 배경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경험적 연출일 것이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제대로 들리는 영화. 우리는 무엇을 애써 무시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눈을 감고 무엇에 귀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정확하고 싶었다_씨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