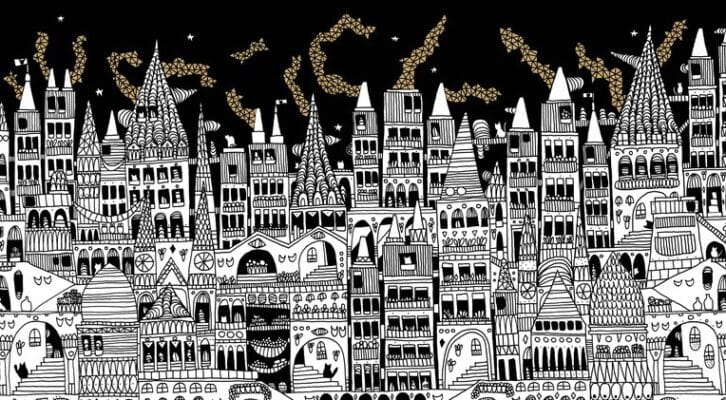지난 1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다양성 · 평등 · 포용’ (DEI, Diversity · Equity · Inclusion)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인종과 젠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연방 기관의 다양성 관련 웹페이지를 삭제하고, 관련 부처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다양성 프로그램을 총괄하던 고위직 간부들에게 임기 종료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자사 내 다양성 관련 정책을 축소·폐지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미국은 마치 1960년대 민권 운동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퇴보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타인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 인종, 젠더, 가치관, 종교,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요. 하지만 이들에 공감하는 것이야 말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섞이며 발전해 왔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술과 사상, 문화가 탄생하는 과정은 언제나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교류하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자에 대한 공감을 포기한다면, 사회는 정체되고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예술 기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오고 있죠. 서로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요.
예술, 꼭 봐야만 하나요?
예술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수없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술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지위, 신체적 조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나 무심코 보게 된 영화 등 일상 속 예술적 경험 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장애인, 노인, 경제적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가진 이들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예술 경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은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배제를 넘어 포용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예술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터치 투어(Touch Tour)’ 프로그램은 시각 장애인들이 조각 작품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 감상이 반드시 시각적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죠. 작품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묘사를 들으며 작품을 만지는 관람객은 예술 작품 감상에 신체적 다름이 장벽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상상속 예술작품을 음미합니다. MoMA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인지적·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알츠하이머 프로젝트(Alzheimer’s Project)’는 치매 환자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술이 감정과 정체성을 연결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죠.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보호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그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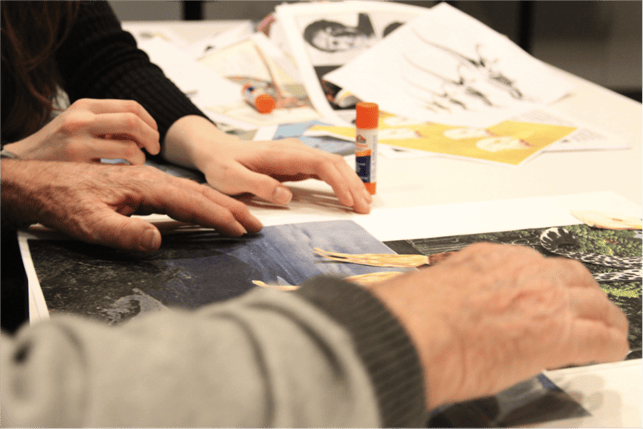
MoMA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예술 감상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에 공감하고, 다른 감각을 통해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한 다정한 결과물이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조건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작품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 차이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술을 즐기기 위한 암묵적 자격들은 새로운 감각적 체험이 되고, 지금 껏 예술적 경험에서 배제되었던 관람객들은 자신도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로써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죠. 이는 단순한 ‘접근성(accessibility)’의 차원이 아니라, 예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의 일종인 셈입니다. 예술이 단절된 개별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때, 우리는 더 넓은 공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뉴욕 현대미술관(MoMA) 시각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터치투어, 아트 인사이트)
뉴욕 현대미술관(MoMA) ‘알츠하이머 프로젝트(Alzheimer’s Project)’
핑퐁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세계
“운동장에서 탁구를 치던 그때, 누구도 저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상대가 누구인지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을 주고받고, 함께 달리고, 웃으며 게임을 즐겼죠.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상대의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사회적 배경 등을 신경 쓰게 되고,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함께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계가 생겨나는 이유는 결국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차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만 안정을 찾으려 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대신 배제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처럼, 다시금 ‘함께하는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체성을 규정하고 재단하는 대신 함께 하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베를린의 현대미술관 ‘그로피우스 바우(Martin Gropius Bau)’에서 열린 ‘퀴어 핑퐁(Queer Ping Pong)’은 탁구와 클럽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퀴어(Queer)’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별난’,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전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정체성 때문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마주하는 이들은, 퀴어 핑퐁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탁구대가 있는 클럽, 클럽 음악이 흐르는 운동장—이곳에서는 기존의 경계가 사라지고, 규칙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DJ가 만드는 비트 속에서, 참가자들은 라켓을 들고 공을 주고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도 없죠. 오직 리듬과 흐름만 존재할 뿐입니다. ‘정상적’인, 특히 흔히 주류라 불리던 이들의 전유물이었던 스포츠는 이분법적 정체성을 벗어난 특별한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즐거운 커뮤니티가 됩니다.

‘퀴어 핑퐁’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에서 ‘누구나 환영받는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공감과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순간을 만들어내죠.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탁구공이 오가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존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단 하나의 공을 주고받는 작은 순간에서 비롯될지도 모릅니다. 공이 오가는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리듬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같은 흐름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아닐까요?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도 강조했듯,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공감이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때 더 강해졌으며,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이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와 사상이 탄생해 왔죠.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포기한다면, 사회는 점점 단절되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경험을 내 경험처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나와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해가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적인 경험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 몰입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서로에 공감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편견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연대하게 됩니다. 예술 기관이 끊임 없이 다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같은 공간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리듬을 맞추는 과정은 편견을 허물고,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탁구대 위에서 오가는 공처럼, 우리 사회도 서로 다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회를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경계를 강화하며, 타자를 배척하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 The Guardian, ‘What we know so far about Trump’s orders on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