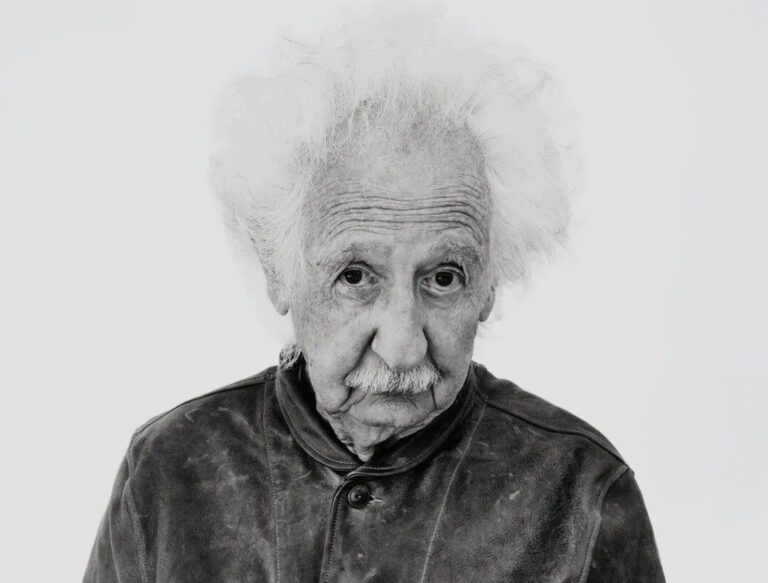요즘 릴스·쇼츠에서는 익숙한 목소리와 몸짓이 우리를 자주 멈추게 한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 ‘삼촌·고모’, ‘학부모’, ‘성형외과 상담실장’, ‘인플루언서’ 등. 정확히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도 어딘가에서 마주친 것만 같은 친숙함에서 순간적인 웃음이 터진다. 흉내를 내는데, 어쩐지 진짜보다 더 진짜를 부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웃음 뒤 묘한 혼란이 따라온다. 저 말투와 제스처는 우리가 떠올린 캐릭터의 본질일까, 혹은 서로에게 요구한 어떤 ‘유니폼’일까. 모사 코미디가 던지는 웃음기 가득한 장면들 사이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씁쓸한 뒷맛이 배어있다.
이 글은 뭉근한 웃음 뒤에 어떤 의문을 지피는 감각을 따라가본다. 모사 코미디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전면(Front) 연출’과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렌즈 삼아 흉내가 어떻게 우리의 역할극을 들춰내는지, 그리고 웃음의 방향은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톺아본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더 흉내 내고 무엇을 그만둘 것인가.
앞무대(Front)의 압축·과장·복제:
그 톤, 그 제스처, 그 대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어빙 고프먼의 관점을 빌리자면 우리는 일상을 공연처럼 연출한다. 직업·세대·위계에 따라 쓰는 말, 착장, 앉는 자세, 공간 사용법까지 앞무대(Front)를 이룬다. ‘일상이 연출’이지만 모사 코미디는 특히 이 전면의 핵심 표식만 골라 압축하고, 더 굵게 과장한 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복제 가능한 포맷으로 유통시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흉내를 본 듯하지만 사실 그 개인 뒤에 겹겹이 쌓인 ‘집단 이미지’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4살 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제이미맘은 아이의 “영재적인 모먼트”를 외치고, 동네 미용실 원장님과 거한 식사를 즐기는 부띠끄 사장님은 “음식 솜씨가 증말 으뜸”이라 말하고, 조카에게 중년 삼촌은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한다. 이런 어휘 습관은 특별히 ‘그 유형’을 인지하는 기표로 쓰인다. 말버릇과 억양을 극단적으로 요약해 즉시 인식을 일으키고, 그 인식 위에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빠르게 쌓는 것. 수많은 일상의 연출 중 유형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짚는다.
이 기술은 규범화된 수행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비슷한 말과 몸짓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물론 누가 더 면밀히 관찰하고 극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느냐와 같은 문제는 코미디를 펼치는 주체의 역량이겠지만). 동시에 위험도 명확하다. 몇 가지 표식이 그 집단의 본성처럼 굳어버리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같은 유니폼을 강제로 입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관점에서 더 다뤄볼 수 있다.
‘~다움’은 유니폼이다:
수행성이 가진 해방 가능성과 낙인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은 다양한 사회적 군상을 모사하는 요즘 코미디의 의미를 한층 더 선명하게 해준다. 수행성은 ‘여성다움/엄마다움/삼촌다움/실장다움’이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로 만들어진 유니폼이라는 통찰이다. 그렇기에 낯선 몸에 정해진 옷을 입히는 순간, 가령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은 여성이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한 ‘실장님 톤’을 완벽히 수행하거나, 30대 남성이 ‘중년 아재 어휘’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때 우리는 본질이라 믿던 것의 빈자리를 본다.
이 깨달음은 두 가지 해방을 낳는다. 우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고정적 인식을 오히려 느슨하게 한다. 유니폼이 연출이라면 멈추거나 바꾸는 상상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또 관찰자 스스로의 경우나 주변에서 목격한 유니폼을 자각한다. “나도 저런 말버릇이 있다”고 인지하면 행위와 정체성을 동일시하던 관성이 약해지고, 말과 몸의 습관을 새로 조정할 여지가 열린다.
하지만 이 수행성의 통찰이 언제나 작동하는 건 아니다. 유니폼을 다시 본질로 오독하는 순간 모사는 유니폼을 벗기지 못하고 강하게 여민다. 나아가 같은 말투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교차점(젠더·계급·나이의 비대칭)을 지워버리면 약자의 수행만 과잉 해석되거나 조롱받기 쉽다. 실존 인물을 특정하거나 외모·신체 특성을 희화하는 방식은 순식간에 구조 비평을 개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전도시킨다.
관객 참여가 만드는 윤리


결국 좋은 모사는 몇 가지 기술을 동반한다. 성·나이·직업을 뒤집는 크로스 캐스팅으로 ‘본질’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전제. 그리고 관건은 방향이다. 유니폼을 벗기는 흉내는 해방이고, 유니폼을 강화하는 흉내는 낙인이기에 몸을 바꿔보기, 문장을 바꿔보기, 맥락을 드러내기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모사를 풍자 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관찰자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연출 참여자로 기능하는 댓글은 모사의 의미를 좌우하기도 한다. 자신들만의 버전을 붙이는, 즉 공저를 유도하는 흐름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과 톤, 행동이 왜 누군가를 ‘긁는’가?” 혹은 “이 캐릭터는 유형을 공유하지만 얼마나 입체적이기도 한가?”로 옮겨간다면 밈은 낙인이 아니라 토론의 문법을 얻는다.
모사 코미디는 타자를 흉내 내며 우리 사회가 매일 수행하는 역할을 비춘다. 좋은 모사는 규범을 가시화하고 대화를 연다. 나쁜 모사는 사람을 고정하고 닫는다. 고프먼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무대에서 ‘전면’을 연출하고, 버틀러의 말처럼 ‘~다움’은 본질이 아니라 반복된 수행의 효과다. 그러니 모방은 사소한 놀이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반복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집단 거울이다.
질문은 단순해진다. 어떤 코미디를 더 지지하고, 어떤 코미디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아줌마다움’, ‘삼촌다움’, ‘실장다움’과 같은 의식적인 옷을 벗기는 흉내는 규범을 흔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유니폼을 그대로 입히는 복사는 편견을 강화할 뿐이다. 모사 코미디가 가진 힘은 바로 그 경계 위에 있다. 흉내로 규범을 비틀고, 더 나은 일상의 각본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무의식적 웃음은, 잠깐의 쾌감에서 멈추지 않고 바뀐 말투와 달라진 장면으로 우리 일상에 돌아올지 모른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지 않다.
- 어빙 고프먼, 『자아 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2016
-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한겨레21, ‘제이미맘’은 무엇을 긁었나 (2025.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