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파리의 라파예트 백화점은 1912년 개점 이후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 없는 유리 돔 내부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유는 “보따리” 시리즈로 잘 알려진 한국의 현대예술가 김수자의 작품 “호흡(To Breathe)”이 백화점의 지붕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관람객들은 외부 돔과 내부 돔 사이에 있는 테라스를 걸으며,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 시시각각 오묘한 빛깔로 변하는 공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다. ‘이걸 작가가 전부 직접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작품 설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인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김수자의 것이 맞는가?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백화점 지붕의 철골 구조에 올라가 특수 필름을 붙이고 작품을 실현한 사람들은 사진에 나온 이름 모를 인부들인데도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예술에서 작품의 골자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작가의 몫이며,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조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예술은 작가의 손끝만이 아닌 작가가 속한 사회, 특히 예술계의 관계적 역학 속에서 탄생한다. 협업, 어시스트, 큐레이션, 크리틱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역학은 예술이란 더 이상 개인의 영역 안의 순수한 진공 상태에 있지 않으며, 예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연결 고리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번 그레이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생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이론들을 짚어보려 한다.
예술계는 ‘장(field)’이다
예술을 사회의 산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field)’ 이론이 있다.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 행동 체계 등을 의미하는 개념인 ‘아비투스(habitus)’를 제창한 것으로 유명한 부르디외는 사회 전반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수한 구조라고 생각했던 예술계, 더 나아가 ‘문화 생산(cultural production)’에 대한 많은 분석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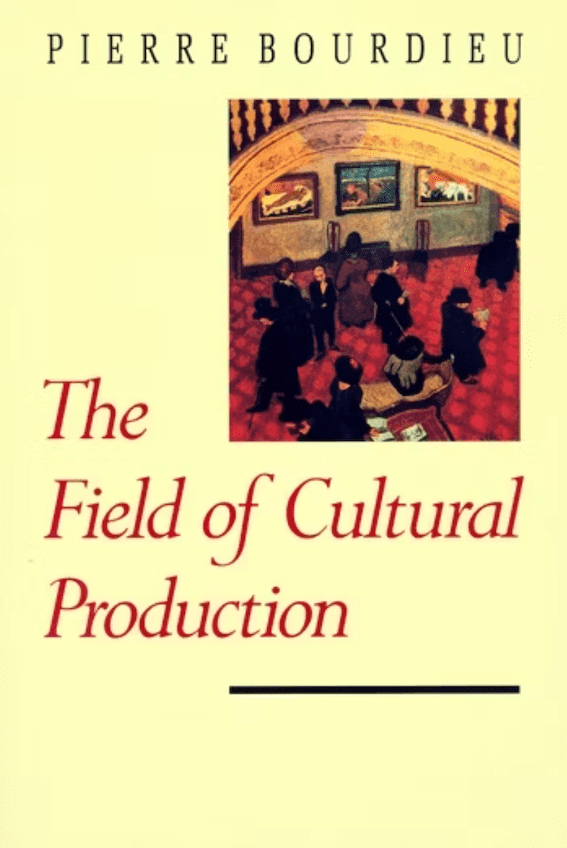
그러한 분석들을 관통하는 테제인 ‘장 이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첫째, 사회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수많은 ‘장’들이 접합된 다차원의 공간이다. 정치의 장, 권력의 장, 경제의 장, 문화의 장 등 고유한 내적 논리를 가지는 일련의 장들은 우주를 이루는 은하계들처럼 사회를 구조화한다. 둘째, 각각의 장에는 ‘자본(capital)’이 분포해 있다. 재화,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인 자본은 장의 지형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다. 셋째, 개인은 이러한 자본을 얼마나 점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장 안에서의 ‘위치’가 결정되고, 넷째, 그 위치에 따른 ‘입장’을 갖고 상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화적 장의 생산물 중 하나인 예술은 필연적으로 장 안에서 창작자가 갖는 위치와 입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모든 작품은 작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면에 집중하던 고독한 예술가가 불시의 영감을 받아 창조해 내는 것이 예술이라는 신비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오늘날 점점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술과 사회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가리킨다. 또한, 이것은 사회가 작가와 예술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반대의 역학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생산물에 비해 더 큰 함의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을 갖는 예술은 사회 속의 여러 관계가 표현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질 또 다른 장을 펼치는 기폭제가 된다. 이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갖는 가치라고 부르디외는 주장한다.
사람이라는 맥락의 예술
부르디외에게 예술계가 창작자의 행동 조건이 되는 환경적 배경이었다면,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Howard S. Becker)에게 예술계란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 자체였다. 부르디외가 문화적 장에 대한 논고를 내놓기 약 10년 전, 베커는 예술이란 예술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집단적 행위(collective activity)’라는 주장을 펼쳤다. 예술가는 집단적 행위의 대표자로서 저작권을 인정받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뿐, 모든 예술은 제작, 배포, 비평 등의 다양한 단계에서 예술계라는 집단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력에는 김수자의 “호흡”을 설치하는 것에 노동력을 제공한 인부들처럼 직접적인 형태도 있지만, 그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갖는 대중까지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베커는 예술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맥락으로 작용하는지를 지적한다. 다시 말해, ‘예술’이라는 예술의 지위는 그것을 둘러싼 예술계가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만 있다면 예술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과도 같다.

또한 베커는 예술을 하나의 완성된 산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함해서 확장적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정에 연관된 사람들 사이의 역학은 늘 유동적이고, 원천적으로 정해진 조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 결과물인 예술 또한 그러한 역학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예술계에 대한 베커의 실증적이고 고착되지 않은 개념은 부르디외의 추상적인 접근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우리의 예술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예술과 사회, 그 관계의 미학
부르디외와 베커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사회 속의 예술, 또 예술 속의 사회에 대한 분석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예술계 내부에서도 이어졌는데, 그중에서도 프랑스 출신의 평론가 겸 큐레이터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1990년대 이후 예술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성을 미학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명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의 핵심을 부리오는 1998년에 출간한 동명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계 미학이란] 독립적이고 사적인 공간이 아닌 인간관계 전반과 사회적 맥락을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삼는 일련의 예술적 실천들[이다].”
_니콜라 부리오, 『Relational Aesthetics』
다시 말해, 부리오의 관점에서 오늘날 예술의 목적은 더 이상 주관적인 심미성 혹은 창작자 개인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맥락들을 참조하고 해석하여 사회 속에 어떤 관계적 역학이 존재하는가를 작품이라는 틀을 이용해 드러내는 것이다.
관계 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로는 대표적으로 올해 1월 말부터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WE≫로 크게 이목을 끈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이 있다. 1996년에 니콜라 부리오가 프랑스 보르도 현대 미술관(CAPC)에서 기획한 전시 ≪Traffic(왕래)≫에도 참여했던 카텔란은 전시장을 관람객이 작품을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여기며 인간의 만남과 관계 그 자체를 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관객들과 작품의 만남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접근 금지 라인이나 경보 센서를 설치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텔란의 작품 “그”에서 관람객은 아주 평범하고 왜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남성의 무릎 꿇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품에 다가가다가 앞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최악의 전범 히틀러임을 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단순한 설치물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고민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카텔란이 히틀러라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인류라면 모두가 공유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맥락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작품 “모두”에서는 9개의 조각상이 천에 덮인 채 나란히 누운 시신들을 연상시킨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접해 온 참사 현장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회적 비극, 그 공동체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전시장의 관람객들은 작품을 매개로 서로 같은 것을 보고, 느낀다는 유대감을 체험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 더 나아가 인간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예술 실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술계라는 사회 속의 사회가 어떻게 직조되어 있는지, 또 사회 속의 예술이 어떻게 그 주변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본질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이론 3가지를 살펴보았다. 부르디외에게서는 사회가 어떻게 환경적인 조건으로 예술에 작용하는지, 베커에게서는 예술과 인간 사회가 맺는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부리오에게서는 작품 속으로 사회를 끌어들이는 예술의 미학적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아름다움, 숭고함, 유일성, 파격. 예술의 외양과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그것을 통해 창작자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종류는 무한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늘날의 예술은 우리가 이루는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유대야말로 저작의 주제이며,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저작은 단순한 창작의 프레임을 벗고 더 많은 것들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이고 관계적인 활동이 된 것이다.
- 연합뉴스, 파리 한복판에 빛나는 무지갯빛 돔…김수자가 만든 사색의 공간(2023. 05. 04)
- Howard S. Becker, Art Worl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Howard S. Becker and Alain Pessin, A Dialogue on the Ideas of “World” and “Field”, Sociological Forum, 2006.
- J. Webb, G. Danaher and T. Schirato, Understanding Bourdieu, SAGE Publications, 2002.
- Pierre Bourdieu,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e Du Reel, 1998.
- Tate Modern 공식 웹사이트, Relational Aesthetics, 2023. 0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