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면 시작하는 일기 쓰기는 지속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꼭 수려하고 읽기 좋은 일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사소한 기록을 이어가는 데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소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어디에 쓰겠어?’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일기는 지속할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여기 작고 사소한 일기로부터 가치를 발견하는 책 세 권을 소개합니다. 읽고 나면 일기의 위상도 조금 달라보일 겁니다.
조경국, 『일기 쓰는 법』
일기가 책이 되는 방법

“사람의 기억력은 자물쇠로 잠근 서랍 같아서 열쇠가 있다면 아주 오래된 일도 어제 일처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_『일기 쓰는 법』
“일기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글쓰기입니다.”
_『일기 쓰는 법』
일기도 책이 될 수 있을까요? 꾸준한 기록을 바탕으로 출간을 해온 작가이자 책방지기인 저자는 일기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자 책의 초석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하고 내밀한 기록이 당장은 부끄러울지라도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고요.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서로 보이지만, 요령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일기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피력하는데요. 일기로 매일을 기록함으로써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글쓰는 능력을 단련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문보영, 『일기시대』
일기라는 창작의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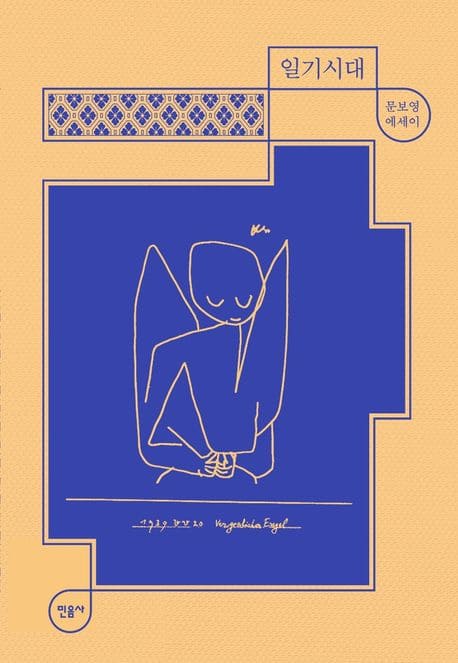
“일기가 창작의 근간이 된다는 말은 흔하지만 사실 일기가 시나 소설이 되지 않아도 좋다. 무언가가 되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 일기일 뿐인 일기, 다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은 일기를 사랑한다.”
_『일기시대』
일기에 진심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문보영 시인은 구독자들에게 손으로 쓴 ‘일기 딜리버리’를 보내며, 자신의 일기를 묶은 책까지 출간합니다. 제목도 ‘일기시대’지요. 삐뚤빼뚤한 방의 평면도와 잠든 시각의 기록, 부록처럼 삽입된 꿈 이야기 등 독특한 형식이 읽는 재미를 선사하는 한편, 사소함과 구체성에서 오는 일기의 형식미를 극대화합니다. 저자의 진지하고 엉뚱한 일기론(日記論)을 읽고 있자면 일기를 얕잡아본 마음은 달아납니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결된 불완전한 아름다움이 일기 속에 있습니다.
아니 에르노, 『바깥 일기』
외부로 뻗어가는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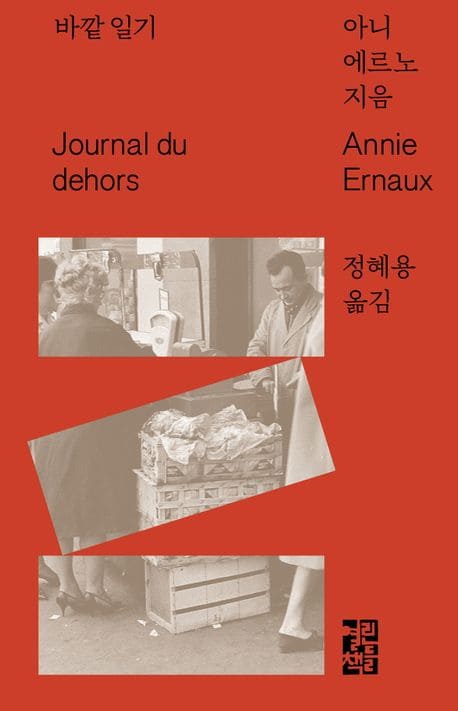
“내면 일기를 쓰면서 자아를 성찰하기보다는 외부 세계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확신이 선다.”
_『바깥 일기』
파리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신도시 세르지퐁투아즈. 아니 에르노가 20년을 살아온 도시의 풍경이 세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바깥을 향한 기록도 일기라 부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한 글쓰기는 반드시 작가 개인의 시선을 거칩니다. 풍경은 그 시선에 의해 구성되고, 각색됩니다. 아무리 감정과 의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말이죠. 저자는 마치 사진처럼 바깥의 실재를 그려내고자 노력했으나, 그 바깥으로부터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외부 풍경을 사실 위주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저자의 생각과 개성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기록의 가치는 꽤 자주 회자되지만, 장르로서의 일기에 대한 평가는 박합니다. 일기란 그저 아무도 못 보는 노트 한 구석에 끄적거리는 것이라고 여겨지곤 하죠. 일기가 문학이, 출판물이, 사회고발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세 권의 책 사이에서 무심히 보았던 일기라는 장르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일기를 쓰는 데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일기에 대한 더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의 글을 통해 그 가치와 원동력을 되찾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