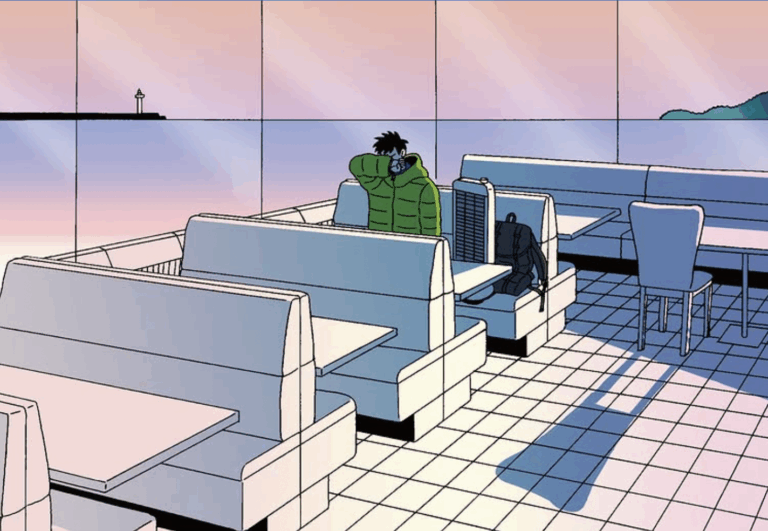8년 전, 뮌스터라는 독일의 작은 도시를 거닐다 커다랗게 인쇄되어 세워져 있는 사진을 만났습니다.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2017(Skulptur Projekte Münster 2017>가 열리고 있는 시기라 도시 곳곳에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보라색 테이블보가 덮인 채 비어 있는 테이블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키 타나카(Koki Tanaka)라는 예술가의 <임시 연구: 워크숍 #7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미지의 것을 나누는 일 Provisional Studies: Workshop #7 How to Live Together and Sharing the Unknown>이라는 작업입니다. 아홉 명의 다양한 세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전시 상황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합의를 거듭 진행하고, 체육관에 침낭을 깔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코키 타나카는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기록했죠.
타나카는 임시로 형성한 커뮤니티를 통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진솔한 방식으로 실험합니다. 서로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서로에게 조금씩 자신을 열어 가며 협업하고 함께 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단순히 온라인이나 단발적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통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신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타나카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바깥의 공동체들을 점점 더 자주 마주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들이 모여 콜렉티브 형태로 활동하고, 도시의 청년들은 지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선택된 가족’ 형태의 주거를 실험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일,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나누는 새로운 가족의 형식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아티클에서는 이 변화의 지점들을 타나카의 질문으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같은 곳에 사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삶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숙이나 고시원, 기숙사, 셰어하우스 등 여러 방식으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동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해왔죠.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용 세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동체 주거는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주거 공간의 기획부터 관계 맺기의 방식까지 삶의 구조 자체를 함께 기획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연대와 감정이 흐르는 장소로 다시 설계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구성하는 태도를 지니고 실천하는 주거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유연하게 열리고 느슨하게 닫히는 관계,
풍년빌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풍년빌라는 기존에 지인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은 공동체입니다. 현재 작가 부부, 일러스트레이터, 건축사사무소 소장 등 세 가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착착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대균 건축가가 설계했고, 김은희 드라마 작가가 후배 작가들이 삶을 실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물 주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달리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하면서 수직으로 중첩되는 공간을 일부러 기획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1, 2층을 함께 사용하는 세대와 2, 3층을 함께 사용하는 세대가 서로 문을 활짝 열면 문턱 없이 곧게 연결되는 중간 지대가 만들어 집니다. 처음에는 살기가 불편했다던 입주자들은 프라이빗한 공간과 공유 가능한 공간이 섞여있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각자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입주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도록 동선과 공유 공간을 설계한 것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밀도를 다채롭게 만들며 일상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변주합니다.
건물의 1층에는 카페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주택 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카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기능을 한층 더 깊이있게 만들죠. 풍년빌라는 거주 구조의 실험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이 있는 하나의 집,
새맘뜰


새맘뜰은 서울 구로구 산기슭에 위치한 공동체 주택입니다. 비정형의 ‘ㄱ’자 땅, 도시 외곽의 경사 면이라는 조건은 건축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동체 주택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90% 가까이를 장기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고, 좋은 설계사와 시공사를 만나 현재 총 여덟 가구가 함께 살고 있죠. 설계할 때부터 서로 살고 싶은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집마다 개성있는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여덟 가구는 서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 관계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었기에, 공간의 배치 같은 중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고 열린 태도로 논의하여 해결했죠. 자금 여건이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출자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여유 있는 이가 더 부담하고 신혼부부는 덜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층과 호수로 나뉜 각 가구가 있지만, 정문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새맘뜰은 하나의 집처럼 기능합니다. 현관에서 복도, 그리고 공용 공간까지 실내로 이어지는 구조는 ‘내 집’이라는 감각과 ‘우리 집’이라는 감각 사이를 유연하게 가로지르죠. 저녁이면 거주민들이 모여 야구를 응원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공용 라운지가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며 돌봄을 실천하기도 하면서 새맘뜰은 물리적인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 느슨하고 단단한 관계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공존’을 실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집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삶,
여백


서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공동체 주택 여백은 노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열 가구가 함께 모여 지은 집입니다. 주거의 기획부터 소유, 운영까지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협동 조합 주거 모델(housing coop)이죠. 초기 설계 단계부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삶에 맞는 평면을 직접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여백에는 서로 다른 구조,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이 살아 숨 쉬고 있죠.
여백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은 노년 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양받기도 어렵고, 혼자 살아가기란 더욱 쉽지 않은 시대에 이웃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갖춘 삶이야말로 현실적인 노후의 해법이라는 것이죠. 여백은 노년의 삶에서 관계 기반의 안전망이 어떻게 주거를 넘어선 삶의 대안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여백은 단순한 공동 거주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주거 형태의 실천이자,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실험이죠. 실제로 여백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당시 격리 중인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등 서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점차 소실되어 가는 ‘이웃’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되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관계의 구조를 설계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일, 단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와 방향이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서로 다른 곳에 만들어진 주거 공동체이지만, 풍년빌라, 새맘뜰, 여백은 모두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감정과 삶의 철학, 일상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실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이는 비슷한 질문 같지만 후자는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주거 공동체라는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