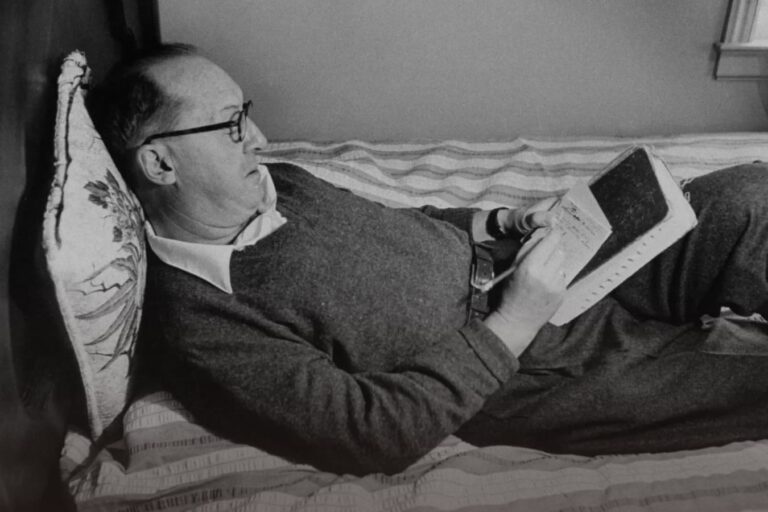지난 5월 21일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 및 개발하기 위해 UN이 지정한 ‘문화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이날을 시작으로 1주일을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며 필자 역시 다양성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대중 음악은 말 그대로 ‘대중’을 한데 묶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으로 다양성을 말하고, 음악으로 다양성을 포착한 3가지 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넬 모네 ‘PYNK’ #여성
‘젠더(성별)가 수행적으로 구성된다’는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의 말처럼 흔히 핑크는 여성의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표식과도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자넬 모네는 이러한 통념 혹은 선입견에 반기를 듭니다. 핑크색 도로, 핑크빛의 화면. 그리고 무엇보다 핑크색을 훤히 드러내는 뮤직비디오 속 여성의 성기는 그가 얼마만큼 사회의 젠더 규정에 날 선 비판을 가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듯하고요.
미니멀한 구성으로 ‘핑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 곡은 적나라한 뮤직비디오 속 묘사와 별개로 부드럽게 핵심을 찌릅니다. “여성의 성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핑크색을 지녔다. 사람의 가장 어두운 면에는 모두 같은 색이 있다”고 말하는 그의 가사 속 한 줄은 오랜 시간 고착된 규정과 인식을 우아하게 비판합니다. 흑인, 퀴어 인권에 관한 영화 <문라이트>, <히든 피겨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얼굴을 알린 자넬 모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평등과 다양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리조 ‘Tempo’ #몸
어떤 면에서 리조는 현재 미국 음악 씬에서 가장 ‘핫’한 스타입니다. 감이 안 온다면 일단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 [Cuz I love you]의 음반 커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오라기 한 장 걸치지 않고 ‘두꺼운(Thick)’ 혹은 ‘큰(big)’ 자기 몸을 가감 없이 꺼낸 채 무심하게 화면을 응시합니다. 이름하여 ‘바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이 음반을 시작으로 리조는 ‘몸 긍정’ 운동의 대명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음악 곳곳에는 넘치는 자신감과 자기애,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특히 래퍼 미시 엘리엇과 함께한 ‘Tempo’에서는 앞서 언급한 단어 Thick과 big을 가져와 자신을 지칭하고 선 말합니다. “난 뚱뚱한 나쁜 여자야. 나는 (춤출) 템포가 필요해.” 리조의 당당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켄드릭 라마 ‘Alright’ #인종
켄드릭 라마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의미를 가진 래퍼입니다. 그가 겸비한 뛰어난 랩 스킬은 물론이고 그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는 타의 추종을 불가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켄드릭 라마가 이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게 된 건 가사와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흑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과 문학을 엮어 적은 노랫말은 철저히 고증적이고 명확히 사회를 응시합니다.
‘and we hate po-po(우린 경찰을 싫어해)
Wanna kill us dead in the street fo sho’ Nigga,(보란듯이 우릴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인마)
(…)
But we gon’ be alright (그래도 우린 괜찮을 거야)’
이 곡의 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흑인이란 이유로 쉽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재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빽빽한 가사와 흡입력 강한 멜로디 사이 녹여냈습니다. 특히 메인 선율의 ‘우린 다 괜찮아(we gon’ be alright)’란 부분은 팝을 자주 듣지 않는 리스너에게 익숙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즉, BLM 운동의 구호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명작 [To Pimp A butterfly]의 수록곡으로 해외의 한 매거진 선정 2010년 최고의 싱글 1위로 뽑히기도 했으며 선명한 메시지 덕에 오늘날 인종차별을 대표하는 노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 음악 최초로 곡 안에 퀴어를 소환한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외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등 다양성을 옹호하고 존중한 곡들은 많습니다. 파릇한 봄 새싹이 피던 시기를 지나 다시 뜨거운 여름의 문턱 앞에 선 지금, 문화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무엇을 위해 구별 아니 차별하는가. 같다는 것은 혹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마음의 폭을 한 뼘쯤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