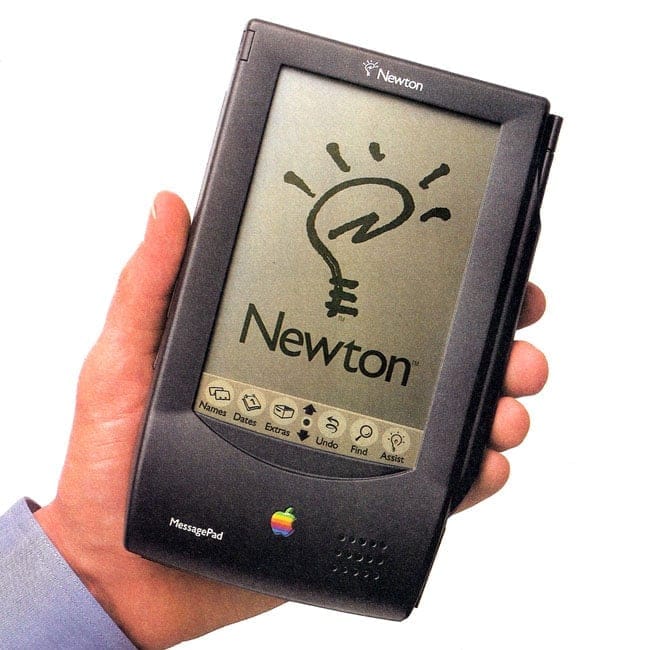보헤미안의 시대로부터 이미 수 세기가 흘렀지만, 예술가들은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하며 창작의 열정을 쫓기 위해 삶 따위는 내던지는 신화적인 존재들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전부터 계승되어 온 예술이란 것의 숭고함과 그것을 향한 사회적인 존경을 과하게 강조하며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은 힘든 현실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는 환상을 암시한다. 이것은 진정한 예술가라면 역작을 만들기 위해 그저 당장의 창작에 몰두해 최선을 다해 삶을 불살라야 한다는 다소 폭력적인 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낭만이라는 미명의 선입견은 예술이 있으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있으려면 그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자꾸만 잊게 만든다. 이번 그레이에서는 이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일’, 즉, 직업으로서의 예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일’ 혹은
노동으로서의 예술
우선, 예술과 ‘일’ 사이의 등식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술가들은 보통의 직업인처럼 생계를 잇고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기가 어려운 것일까? 네덜란드의 예술가이자 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인 한스 애빙(Hans Abbing)은 그러한 이유로 “예술 자체가 지닌 높은 가치 때문에 예술가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꼽았다. 다시 말해, 예술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좋은 것’ 혹은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술가라면 그것을 위해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예술계의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작품 활동은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대가로 사회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논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스 애빙이 2014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94%의 예술가는 전체 노동 인구 평균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예술적 가치와 경제성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벌려 왔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스 애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을 무엇으로 정의할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에 달렸다. (중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구분함으로써 예술 작품에 등급을 매긴다. 이때 구분은 수많은 단계에 따라 이뤄지는데, 더 예술적인 작품과 덜 예술적인 작품들을 하나의 선 위에 상대적인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열한다. 그리고 연속선 위의 어느 지점에서 경계선을 그어, 경계선 위는 상위예술, 순수예술로, 혹은 ‘진정한’ 예술로, 경계선 아래는 하위예술, 대중예술, 혹은 예술이 아닌 것이라고 부른다.”
_한스 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하는가』 p18
즉, 우리는 작품이 얼마나 순수하게 예술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지를 기준 삼아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돈은 천박하고 비루한 것, 따라서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해 상업성을 갖는 것은 그만큼 예술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은 대중 뿐만 아니라 예술계 종사자, 더 나아가 예술가들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다.

예술이 직업적인 역학을 갖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요인은 예술가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드물게도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 공동 발표한 담론에서 미학자 다니엘 차일드(Danielle Child), 예술가 겸 큐레이터 제니 리차드스(Jenny Richards), 큐레이터 헬레나 렉킷(Helena Reckitt)은 예술을 ‘정열적인 노동(labor of love)’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란 그 발화점을 내부에 둔, 즉, 시장의 다른 노동처럼 타인이 일으키는 수요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공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정당한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작업 동기가 불씨처럼 남아있는 한 사실상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돈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예술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를 우선시하는 예술가들은 노동에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준에 맞춰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일’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표준에 따라 값을 매기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일’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시도는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시장 경제에 예술가들의 생계를 맡길 수 없기에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맡는 경우와 예술계 안에서 내부적인 자구책으로 예술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다음의 경우들을 소개한다.
1) 아이슬란드의 사례
유럽의 아이슬란드는 전체 인구의 10%가 작가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슬란드 정부는 예술가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Artist Salary Fund(예술가 급여 기금)’를 설치하여 연간으로 진행되는 선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예술가들이 다달이 월급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했다. 2024년에 이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된 예술가는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선정된 241명으로, 이들은 각자의 활동 기간과 규모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매달 507,500 아이슬란드 크로나(ISK), 즉, 약 49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작가, 극작가, 시각예술가, 배우, 안무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아이슬란드 사회는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의 안정적인 공급을 더욱 공고히 보장 받을 수 있고, 예술가는 자신의 존엄과 직업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

2) 독일 베를린의 사례
독일 또한 예술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주최하는 여러 공모전과 지원 사업이 매년 더욱 갱신된 형태로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도 프리랜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필자가 특히 인상 깊게 바라보았던 독일의 사례는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 수도 베를린의 시 정부가 거의 모든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랐던 락 다운(lock-down) 기간에도 미술관, 갤러리, 서점 등의 문화 시설을 ‘생활 필수 시설’로 분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일이었다. 필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 준 베를린의 아티스트북 갤러리 겸 서점인 ‘아인부흐하우스(einBuch.haus)’의 김재경 디렉터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공간을 방문하며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고 예술이 갖는 본질적인 의의를 곱씹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는 예술은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이 멈춰도 필수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사회적인 가치관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내의 사례
국내의 경우에도 예술(가) 지원을 위한 기반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아르코(ARKO)’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다양한 전시와 교육, 공모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 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 전반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예술인활동증명’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일’로서의 예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계 내부의 다양한 플랫폼들도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 작가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예술 전시공간 ‘레인보우큐브’의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인 <처음의 개인전>과 나이와 경력, 작업경향 등에 구분을 두지 않고 독창적인 실험 정신을 가진 예술가를 선정하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의 전시후원 공모전을 꼽을 수 있다.

사회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예술이 ‘일’로서 인정받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창작이라는 극도로 주관적인 활동에 대한 사회의 개입은 더 많은 의문과 한계가 드러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모든 지원 사업들은 사회의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예술의 범주로 분류할지, 어떤 예술이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예술가가 더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선정과 탈락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예술이라는 ‘일’을 논할 때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예술을 재단해야 한다는 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국내의 전시 지원 사업들의 경우, 예술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커리어를 시작하는 청년 예술인으로 범주를 좁히거나, 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예술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연 누가 지속될 예술과 그렇지 않은 예술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애초에 그러한 구별에 의미가 있긴 한 것일까? 우리는 어디까지 예술의 지속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사회적 시스템 안에 예술이 담길 수 있긴 한 것일까?
결국 우리는 예술이라는 ‘일’을 논할 때 완벽한 관점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그로부터 이어진 청사진이 예술의 틀이 되기 보다 그것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가장 넓은 울타리가 되는 것을 꿈꾼다. 예술가가 빠듯한 현실에 지쳐 소진되는 것이 아닌, 하고 싶은 말을 작품을 통해 모두 전했다는 만족감에서 활동을 종료할 자유가 보장되는 건강한 지속의 상태를 꿈꾼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껄끄럽고 복잡하더라도 예술과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연합뉴스, “예술가가 가난한 이유는 예술의 높은 가치 때문” (2014.11.27)
- 한스 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하는가, 21세기북스, 2009
- Danielle Child, Helena Reckitt and Jenny Richards, Labours of Love: A Conversation on Art,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2017
- RÚV, 241 artists to receive salary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