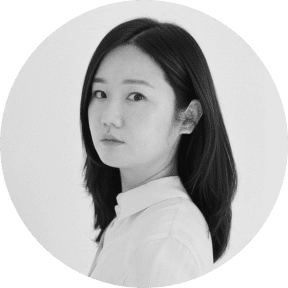지난 10월 19일, 서울대학교 종합연구동에서는 (사)음악미학연구회가 주최하는 〈한국창작음악연구 ‘비평과 해석 사이’ 학술 포럼〉이 열렸다. ‘비평과 해석 사이’는 음악미학연구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내 클래식 창작음악 비평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의 발간과 함께 열리는 이번 학술 포럼의 주제는 ‘환경과 자연’이었다. 여기서는 현대음악, 자연, 기후위기 같은 말들이 주요 키워드로 거론되었다. 가장 뜨거운 논의로 제기된 문제는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나는 이 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서 열린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글에서는 그때 나눈 이야기를 비롯해 거기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까지를 더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자연이라는 이데올로기

‘기후 위기에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기 전에, 이 포럼의 주제가 ‘환경과 자연’이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환경과 자연은 기후 위기와 동의어가 아님에도 환경과 자연이라는 주제가 기후 위기를 중심 화두로 다루어졌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환경,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계있다. ‘환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나 조건, 배경, 또는 맥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말이다. 그러니 ‘환경’ 그 자체는 가치판단이 수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오염된 생태계와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환경’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중립적인, 혹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환경보다는 ‘문제’로서의 환경이라는, 특수한 의미에서의 환경을 떠올리게 되는 면이 있다.
‘환경’이란 개념보다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자연’이다. 더 정확하게는, 자연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자연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이다. 자연(自然)이 ‘본래 그대로의 것,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듯 보인다. 이데올로기는 자연과 다르게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사유들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견고해진 의식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데올로기는 자연과 다르게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가 인간적 의식 체계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연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에 대한 왜곡된 사유를 다시 살필 겨를을 얻게 된다.
저기 자연이 있다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다. 정말로 “본래” “그대로의 것”으로서의 자연이 존재하는가. 어딘가에 “진짜”가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연과 환경은 망가졌고, 그것을 본래의 형태로 되살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불가능하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래 그대로의 자연이 대체 어떤 형태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원래 형태로 되살리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라는 점을 의미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본래”의 자연을 되살려야 한다는 태도가 자칫 인간적 관점에서 왜곡하여 이해하는 ‘타자로서의 자연’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다. 나아가, 혹 “본래”의 자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의 달라진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여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역시 담고 있다.
음악가들은 이런 점을 이미 여러 역사적 계기들을 통해 배웠다. 가령, 과거의 음악을 당시의 형태 그대로 되살려 연주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연주’(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HIP) 운동을 주장했던 초기의 고음악가들의 태도는 이상화된 자연을 향한 접근과 정확히 닮아 있다. 악보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거기 담긴 작곡가의 ‘의도’를 곡해 없이 구현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나, 위대한 작곡가의 위대한 작품에서 위대함을 발견해 내려는 교조적 음악 분석의 접근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서양예술음악 역사의 국면들은 당연한, 그래서 ‘자연’인 듯 간주되는 관념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일깨운다.

많이 돌아왔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연 본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환경’이라는 개념 역시 사실은 똑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자연, 지구, 생태계, 기후 위기 같은 키워드가 주요 담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근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자연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상적인 자연을 가정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오소리 되기
그렇다면 대체 자연이란 무엇인 걸까.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에 그린 자연을 떠올려 본다. 8절지 스케치북을 가로로 내려놓고, 스케치북의 상단 3분의 1의 공간에 하늘과 구름을 그린다. 그 바로 아래는 저 멀리 보이는 흐릿한 산을, 스케치북 하단 3분의 1에는 조금 더 가까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채워 넣는다. 나무와 꽃, 풀, 새, 그 사이를 가르는 시냇물. 상상력이 그리 빈곤하냐고 따져 물으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대체로 우리가 떠올리는 자연의 모습이 이렇듯 산과 나무, 꽃과 들판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당신이 떠올린 자연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 생태 철학자 티머시 모튼의 물음은 생각해 볼만하다. 모튼은 묻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 오소리에게 물어도 똑같은 모습일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 좋을 대로의 자연을 그동안 자연이라고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러니 자연을 생각한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지구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쩌면 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플라스틱을 왜 줄여야만 하는지,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하는 일 보다도, 인간적으로 사용하고 생각하는 자연을 재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오소리의 입장에서 자연을 생각해 보는 일이다. 이와 같은 통찰은 생태학적 사고란 경고성 정보를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자연을, 세계를 포기하는 일임을 알려준다.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되돌아가 본다. 기후 위기에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는 모튼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병든 자연을 생각하는 일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를 포기’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나’가 아닌 다른 것, 곧 ‘타자’를 배려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데 사실, 음악가는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만한 토대를 이미 갖춘 사람들이다. 실제로 음악가는 타자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가령,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라. 수많은 악기가 함께 울리면서도 그 소리가 뒤죽박죽 뒤엉키지 않고 조화롭게 들리는 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하나하나가 ‘나’의 소리를 얼마간 포기하고 ‘옆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소리를 위한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후 위기에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물음은 잘못되었다. 진정한 음악가라면, 그는 이미 기후 위기에 관해 무엇인가 하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음악가는 어쩌면 생태학자와 구별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이 말은 반대로도 새길 수 있을 것 같다. 생태적 삶을 사는 당신은 이미 훌륭한 음악가라고.
- 티머시 모튼, 『생태적 삶』 앨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