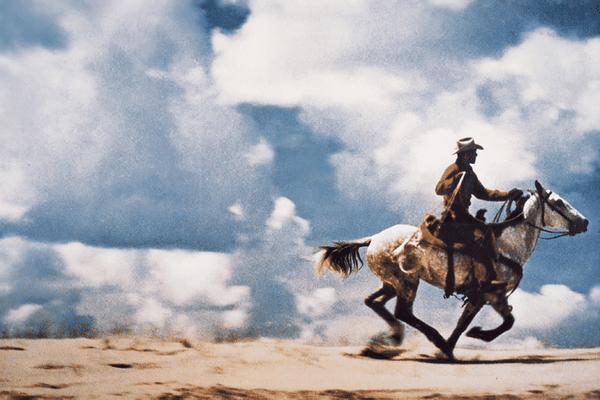창문 틀을 넘어 고요히 방 안을 채우는 빛을 본 적 있나요? 빛은 어떤 경계도 자연스럽게 넘어 자기 자신으로 물들입니다. 유리를 통과하고, 물을 가로지르고, 심지어 진공의 고독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간직한 채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경계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자신을 바꿔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 밖에 머무르거나. 이런 이유때문일까요, 필자는 빛을 그린 작품들을 보며 왠지 모를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을 깊이 들여다본 작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생채기가 나도 묵묵히 경계를 넘어가는 이들에게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영
빛이 스며든 시간이 멈춘 자리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은 사실 착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미시적 움직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시간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론을 (아직)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보영의 작품을 보면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그의 그림에는 정지된 시간이 고여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직 공간을 비추는 빛 뿐이지만 그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빛의 움직임으로 벽에 남긴 흔적이 드러나다가도 시간이 거꾸로 흐르듯 빛이 점차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지된 시공간 속에서 관람객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잃어갑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두 발이 떠올라 일상의 논리가 닿지 않는 먼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현실의 작고 무른 나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빛을 그리는 화가’라 불리는 정보영은 세상의 다양한 빛을 담아냅니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 눈부신 창밖의 풍경, 커튼 사이로 스미는 은은한 빛까지 각기 다른 온도와 질감으로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빛이 마치 정지된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명이 오브제를 비추듯 시간이 박제되어 있는 모습은 친숙한 일상을 낯설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정보영은 “일상적이면서도 낯선 느낌이 날 때, 일상이 각별하게 다가올 때 그림이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이 모순적인 공간, 있는 듯 없는 듯한 텅 빈 공간 앞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주먹을 쥔 손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온 몸에 힘을 주며 살아 내고 있다면 정보영의 빛이 이끄는 무중력의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앨리스 달튼 브라운
지나온 적 없는 시간이 그리워지는 빛의 마법

미국의 극사실주의 작가인 앨리스 달튼 브라운은 바람, 공기, 빛과 같은 자연물을 손에 잡히게 그려냅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 빛은 외벽이나 열린 창문을 통해 집을 서서히 물들이는데요. 그 풍경은 가장 평화롭고 고요했던, 잠시 잊고 살았던 어떤 시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설령 지나 온 적 없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독특한 빛의 표현은 그가 청소년기를 보낸 뉴욕 이타카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자주 끼고 해가 늦게 떠오르는 이타카의 날씨는 빛의 움직임을 더욱 느리고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했고, 작품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초기작에서 이같은 느린 빛은 더욱 잘 발견됩니다. 1970년대경 앨리스는 뉴욕의 근교로 이사하며 집 근처 농장의 헛간과 곡식 저장고인 ‘사일로’를 소재로 작업 합니다. 그는 건물 외벽에 묘사된 빛의 흐름을 쫓으며 대상을 그리는 대신 대상의 그림자를 묘사합니다.

후기의 앨리스 달튼 브라운은 상상 속 빛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인 <Summer Breeze> 시리즈는 1995년 친구의 집에서 보았던 커튼이 휘날리는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집 내부의 가구를 모두 지우고 오직 빛과 바람이 드는 실내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Late Breeze>에서 물가에 홀로 나부끼는 커튼이라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비록 상상 속 풍경이지만 이 광경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았던 어떤 시절을 비추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죠.
마이크 실바
빛으로 추억하는 지나간 순간들

침구 더미 아래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얼굴을 이불 속에 묻고 베개 위에 팔을 얹은 채 잠든 듯한 모습. 바로 마이크 실바의 Gary(2023)입니다. 창문은 보이지 않지만 침대 위로 따뜻하게 쏟아지는 햇살이 그 존재를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 실바는 피사체를 사랑했던 듯 합니다. 이불 위를 포근하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는 실바의 애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실바의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찍어온 친구, 연인, 그리고 함께한 공간의 필름 사진이 그의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유백색의 빛으로 집 안의 모습, 옛 연인과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가 사랑했던 시간을 한 편의 스냅샷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가에 고요히 놓인 구식 팩스기를 그린 Window(2023), 과거 연인을 그린 Red(2023)에서 이러한 정서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지나간 순간들을 향한 향수와 함께 덧없는 젊음에 대한 멜랑콜리가 느껴지는데요. 작품 속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부드럽게 감싸며 몽롱하고 붙잡기 힘든 기억의 특질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실바의 작품에서 빛은 부재하는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또 놓아주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사랑하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완전한 변태를 겪어야 하듯 우리도 종종 어떤 경계 앞에서 변화를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빛은 조금 다릅니다. 경계나 매질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외부와 조화롭게 상호작용합니다.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뿐 스스로를 물질적으로 손상시키진 않습니다. 세 작가가 그린 빛도 이와 비슷합니다. 피사체와 빛 서로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며 조응할 뿐입니다. 이러한 빛의 방식은 경계를 넘는 이들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바뀌지 않아도, 네가 너여도 충분히 괜찮다는 말을 반짝이는 따뜻함에 실어서 말하고 있는지도요.
- 이진숙. 이진숙이 만난 화가 | 작가 정보영. 2008.11. 톱클래스
- 앨리스 달튼 브라운, 빛이 머무는 자리. 2021.07. 마이아트뮤지엄
- Finn Blythe. 2023.07.24. Mike Silva Revisits Intimate Memories of Interiority. FRIE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