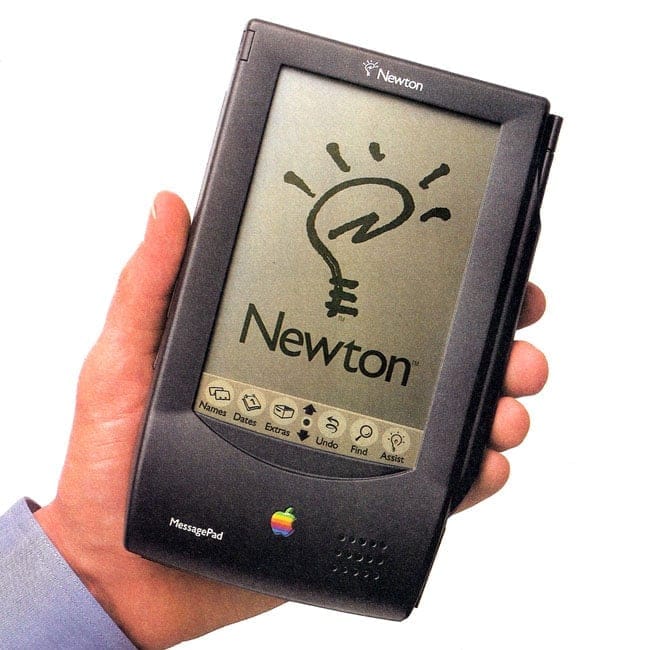예술 작품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는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화두다. ANTIEGG에서도 임현영 에디터가 “예술과 도덕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아티클을 통해 다룬 바 있다.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에 대해 인심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통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전시 작품을 바탕으로, 미술계를 향한 도덕적 잣대가 유독 곧은 이유와 그 타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예술을 위한 희생은 무엇이 다른가

전남도립미술관의 《애도: 상실의 끝에서》가 때아닌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전시는 팬데믹으로 상실의 기운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 슬픔을 애도하고 삶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마주한 것은 삶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출품작 “Fish”는 의료용 링거팩 안에 금붕어를 한 마리씩 넣고 밀봉하여 매단 설치미술 작품으로, 숨이 끊어져 가는 금붕어의 모습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이중성을 은유했다. 열흘 만에 15마리 중 5마리가 폐사하고 관람객과 동물 보호 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미술관은 금붕어를 모두 회수했다. 또한 사과문을 통해 예술과 윤리 간의 갈등에 대해 더 고민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미술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작품 설치 과정에서 누구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으며, 거리낌 없이 관람객에게 가닿았다는 사실에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개인의 예술적 표현을 위해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Fish”를 기획한 유벅 작가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소신은 이러한 생각에 물음표를 던진다. 그는 작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일같이 어획하면서도 죽어가는 금붕어는 안타까워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려 했다”라며 “도덕성을 지적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너머를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물고기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 포획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물고기를 낚는 행위를 단순한 오락으로 즐기곤 한다. 생명이 희생되는 것은 다름이 없는데 우리는 왜 수천 마리의 생선보다 미술관에 전시된 다섯 마리 금붕어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할까. 먹기 위해 행하는 도살을 도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것은 거북해하면서, 왜 작품을 위한 희생은 용인하지 않을까.
공간의 괴리가 만드는 거부감
이는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전시’라는 설정값이, 고통이나 희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괴리에서 기인한다. 변기가 작품이라는 미명 아래 미술관에 들어왔을 때 세간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말이다. 사회적 통념상 예술은 세련되고 고상한 것이며, 미술관은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공공미술관인 경우 작품이 곧 공중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무결해야 할 공간에서 끔찍하고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오는 강렬한 자극을 의도하여 작품을 만드는 현대 미술가들도 있다. 고수연 에디터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를 통해 소개한 데미안 허스트도 그중 한 명이다.

‘죽음의 예술가’라고도 불리는 그는 동물 사체를 활용한 작품으로 현대 미술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박제한 작품들은 그에게 큰 유명세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꾸준히 그의 이름을 도덕성과 생명 윤리라는 도마 위에 오르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데미안은 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잔인함보다는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하기를 바랐다.
데미안의 작품 속 동물들처럼 인간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생명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수산시장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의 목을 내리쳐 횟감으로 내어놓고, 고사상에는 죽은 돼지의 머리가 그대로 오른다.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미술관에서만큼의 위화감은 아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기도 할 뿐더러, 동물을 향유 대상이 아닌 식재료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자리에 오래 ‘전시’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술 작품을 위한 희생에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기울여지는 이유가 된다.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대안의 존재
또 다른 이유는 생명의 도구화가 예술 작업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백질과 영양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육식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식량이 풍족해지고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누군가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삶의 기본 요소인 ‘식(食)’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부가적으로 등장한 문화예술이라면 더더욱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이 없길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고 메시지를 담기 위해 활용할 도구가 꼭 생명이어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이유는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물 대신 CG를 활용하는 영화계의 움직임처럼, 반드시 생물이 소재가 되어야 하는 작품이라면 기술을 통해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횟집에서 손질되는 수많은 생선과 미술관에서 죽어간 다섯 마리 금붕어를 향한 대중의 인식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법적으로도 식용으로 분류되는 횟집 생선과 달리, 관상용 금붕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작가의 기획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계를 향한 도덕적 잣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된다. 변화의 과정에서 모순은 자연히 발생하고, 모순을 제거해 나갈 때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으니 이 정도는 부도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는 발전적이지 못하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도 미술관을 향해 기울여진 단단한 잣대 아래 보호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 삼아 미술관 바깥의 존재들까지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로톡뉴스, 금붕어 죽어가는 모습 전시…’예술’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학대’, 2022.07.14
- 조선일보, [기자수첩] 죽이는 미술관?,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