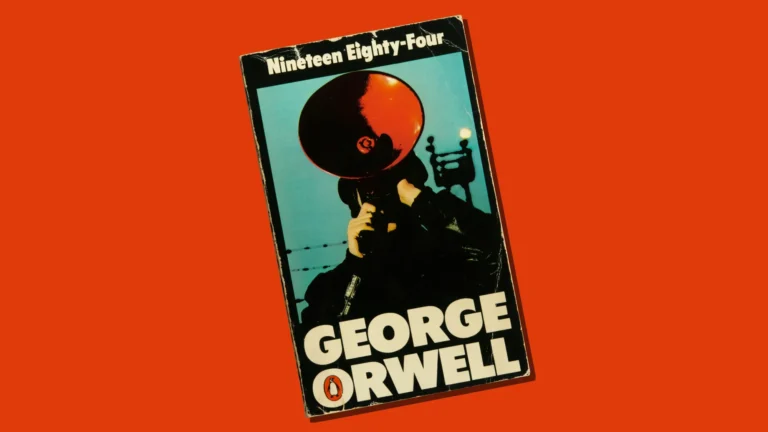LP는 Long Playing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장시간 재생’이라는 의미로 판 재질이 플라스틱(비닐, Vinyl) 이어서 바이닐로 불리기도 하다. LP가 처음 생산되던 1960년대만 해도 음반 한 면에만 30분 정도의 곡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웠으며 CD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장 효율적인 음반 규격으로 인정받으면서 20여 년간 LP 체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CD와 카세트테이프가 등장하고 더욱 더 포터블한 방식의 음악 청취 수요가 늘면서 LP 시장은 작아지기 시작했고 MP3와 스트리밍 방식이 등장하면서 사실상의 몰락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 거의 모든 매체와 수단이 디지털화되는 21세기, LP 수요는 다시 폭등했다. 다름 아닌 MZ세대에 의해서 말이다. 디지털에 능숙한 이들이 아날로그식의 음반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취미에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미지로 말하고 이미지로 읽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과거엔 자기소개서에 취미로 음악감상을 적어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SNS를 통해 얼마든지 음악감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즉 LP를 수집하는 행위나 LP 관련 공간을 방문하는 모습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쿨하고 멋있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취향을 가시화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MZ세대의 자기표현 욕구가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 세상의 한 가운데로 다시 끌어 올렸다.
편리한 건조함이냐, 불편한 생생함이냐

3G와 LTE의 등장은 우리들의 삶을 빠르게 바꿨다. 특히 음악을 듣기 위해 특정 공간을 찾아가야 한다거나, 음반을 소장하거나, 기기에 보관해놓고 듣는 세상도 사라지게 했다. 스트리밍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검색 한 번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음악을 듣기 위해 투여되는 비용을 최소화 시켜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이 무형화되면서 점점 공간과 환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듣는 음악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코로나19는 차가운 디지털 세상에서 음악을 듣던 MZ세대에게 오프라인 세상에서보다 더 따뜻하고 생생하게 교감할 수 있는 음악 향유 문화에 대한 갈망을 틔웠다. 굳이 LP판을 사고, LP바나 청음실과 같은 공간에 찾아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과 관련된 고유한 자기의 서사를 만들고,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유보다 소유를 원한다

MZ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많이 배웠지만 더 가난한 세대로, 워싱턴포스트는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칭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장년층 실업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19~29세 청년의 은행 대출 규모는 8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자금 대부분이 생계유지와 상승한 전·월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필자를 포함한 MZ세대는 소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창 공유경제가 붐이었던 것도, 소유의 부재를 공유로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온전한 ‘내 것’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반면 ‘나를 위한 소비’라는 명목하에 무언갈 수집하는 행위는 일상 속 소소한 소유를 가능케 한다. 목돈이 필요한 집이나 차보다 LP 한 장을 소유하기가 비교적 쉽기에 LP판이 쌓여감에 따라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동일한 맥락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의자나, 전등, 1인용 소파 등 소가구 구입 열풍이 불면서 턴테이블 구입 수요도 함께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LP 소비문화는 더욱 탄력을 얻었다.
사치와 대안, 아슬아슬한 경계

LP 문화는 우리에게 획일화된 소유의 개념과 기준을 바꿔놓았다. 집과 차가 없어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는 대안적 삶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상 서울의 여러 바이닐 샵에서 판매되는 판들의 가격은 비싸게 형성되어있고, 구하기 어렵거나 희소가치가 높은 판들은 장당 몇십만원을 훌쩍 넘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LP를 사거나 듣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LP를 구입하는 비용이 그렇고 공간을 찾아보기 위해 시간을 들인다거나, 커피 한 잔, 맥주 한 병을 시키고 바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다. 게다가 음악산업이 뉴트로(newtro)를 기치 삼아 아티스트 굿즈로 LP를 무분별하게 생산해 판매하면서 우리는 다시 낭비를 부추김당하고 있다.
당면해본 적 없는 구조적 가난에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안적 삶을 찾고 있다. 프랑스의 대문호 오 노레 드 발자크는 현대인의 삶을 우아한 삶과 바쁜 삶으로 나눈 바 있다. 누군가는 LP 문화를 우아한 삶의 한 방편으로 치켜세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치스러운 문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LP의 사전적 정의로 돌아가 보자. ‘길게 재생하기’ 우리가 길게 재생하려는, 좀 더 지속 가능해졌으면 하는 삶을 위해 어디까지 소비하고 무엇을 누려야 할까. 적어도 낭만이 될지, 낭비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