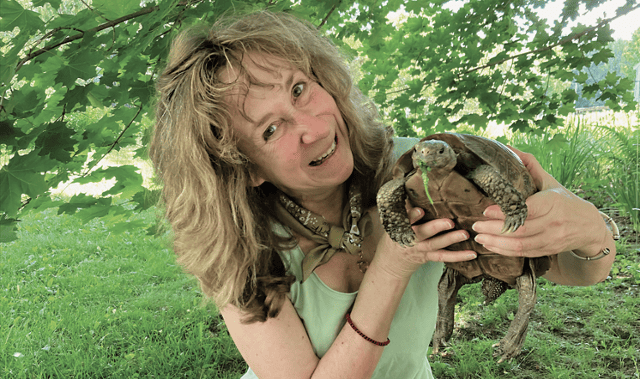환경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성역 없이 모든 곳에서 기후 위기를 부르짖는다. 하루에도 우리의 눈길, 발길이 닿는 모든 것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묵직하게 자리 잡는 요즘, 막상 친환경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애매한 과도기를 이용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불편이 낳은 의심

튼튼하던 플라스틱 용품을 종이로 대체했을 때 불편은 상당하다.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카페, 식당 등 상업 시설 일회용품부터 사무실 소모품까지 웬만한 플라스틱은 종이로 대체되는 추세다.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에게 의심의 불씨가 싹튼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카페에서 사용하던 종이 빨대다. 종이 빨대를 음료에 오래 담가 둘수록 음료의 맛이 이상해진다는 평가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빨대를 마다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할 만큼 종이도 친환경적인지 의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하나둘 종이로 대체된 용품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백되지 않은 나무색의 크라프트 종이로 만들었다면 친환경 컵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했던 종이컵은 플라스틱 컵만큼이나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고, 불편하게 사용하던 종이 빨대도 반드시 플라스틱보다 낫다는 건 아니라는 뉴스도 계속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환경 보호를 위해 원료가 대체된 상품을 소비, 폐기하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기사도 퍼진다. 게다가 불난 집에 기름 붓듯 친환경을 상술로 활용한 기업의 의도가 발각되는 빈도수도 잦아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친환경 운동인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맞대응하듯 커지는 중이다. ‘그린 딜레마’에 놓인 듯한 소비자로서는 이 와중에 플라스틱 대용으로 전면 대체된 종이의 존재 또한 미덥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면 의구심이 든다.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든다. 그럼, 종이를 소비하는 것은 친환경과 정반대이지 않은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종이의 노력
상술한 대로 종이 생산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종이는 다른 원료들에 비해 최대한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료다. 환경에 덜 해로운 또 다른 대체 원료를 찾는 과도기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번 아티클에서는 우리가 흔히 ‘친환경 종이’라고 부르는 종이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며, 종이가 환경을 덜 해치는 재료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이다. 종이의 환경친화적 생산 방식 자체를 통해 아직 보편적으로는 불분명한 친환경 정의에 대한 다채로운 담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친환경 종이에 대한 여러 분류 기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산림인증, 환경경영인증 마크를 받은 종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만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로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인증협약프로그램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등의 기관이 있다. 해당 기구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는 산림을 인증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인 것을 인증한다. FSC, PEFC 인증을 받기란 매우 까다롭다. 무분별한 벌목을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며 숲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산림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목재를 다루는 업체는 환경 경영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한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부터 철저히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것. 모든 유통과정에서 FSC 인증을 받은 업체를 거쳐야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최종 제품에 FSC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해당 마크는 말 그대로 지속 가능을 위한 ‘증명된 목재’로 큰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종이 채택 과정에서 해당 기구의 인증을 받은 종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환경 경영 감사를 통과한 기업에 부여하는 EMAS 마크,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두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에 부여되는 독일의 블루 엔젤 마크,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효과적인 환경 및 품질경영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마크 등 여러 친환경 인증, 환경경영인증 마크들이 통용되고 있다.
2) 재생지

재생지는 쓰고 버린 신문지, 잡지, 우유 팩, 자투리 등의 종이를 재활용한 펄프로 만든 종이이다. 새로운 나무를 베고 새로 펄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화학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물론 종이를 재활용하며 폐지 수거 비용, 오염 및 잉크를 빼는 탈묵 과정에서 비용 및 화학 성분이 생겨나지만, 아예 새로운 종이를 생산하는 것보다 비교적 환경친화적인 방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종이를 재활용하며 생기는 재생 펄프 특유의 색, 질감을 오히려 선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 비목재 펄프를 사용한 종이

나무를 한번 베면 성숙한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훼손의 영향도 크다. 하지만 나무가 아닌 원료로 종이를 만든다면 어떨까. 과일 껍질 같은 농작물의 부산물, 돌가루, 울 섬유,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식물 등 독특한 재료로 펄프를 사용한 종이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대나무처럼 일반 나무보다 생장 주기가 빠르고 온실 가스 흡수율이 좋은 식물들은 숲의 훼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목재 펄프 또한 일반 화학 펄프만을 사용한 종이에 비해 빛이 바래거나 특유의 질감을 갖고 있어 독특한 디자인 매력을 더해줘 인기를 끌고 있다.
4)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종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풍력,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종이도 친환경 종이로 분류된다. 기후 변화 대응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종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유사 마크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만한 활동으로 탄소배출권 구매, 숲 조성,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 혹은 제품에 탄소 중립 마크를 부여하기도 한다.
무엇이 친환경인가

지속 가능한 환경, 특히 산림 보전을 위한 종이의 변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이 자체가 완벽한 친환경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은 어차피 대두될 수밖에 없다. 어떤 원료든 인류가 무엇을 ‘소비’하는 것 자체로 환경에 해로운 지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모든 과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해결을 위한 급한 불이 발등에 떨어진 지금, 우리는 무엇이 친환경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말장난에 가까운 기업의 상술에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배신감에 분노하기도 하고, 명확한 효과 없이 기후 위기 대응 협약 기한은 미뤄지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한다. 결론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 무기력하게 기대게 된다.
하지만 종이가 더욱 완전한 친환경 대체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어떤 방안도 완전하지 않은 지금, 환경 보전을 위해 조금씩 발을 내딛는 과도기에서 ‘무엇이 친환경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주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종이가 있는데, 당신이 찾는 ‘친환경’ 종이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종이를 넘어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악의 임계점에 도달한 지금은 모든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그 어떤 대안도 당장 100%의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해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대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더디지만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면서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찾아야 한다. 그 증거가 바로 지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종이의 진화다.
종이도 지구를 위해 제 역할을 한다. 하물며 환경 파괴의 주범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해결은 커녕 문제의 정의조차 잡지 못해 휩쓸리다가, 혹은 분노와 비관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 적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친환경’ 슬로건이 남발되는 시대. 지금이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친환경의 기준을 굳게 세워보자.